강렬한 데뷔작이었다. 독립영화의 수작으로 평가받는 ‘파수꾼’이 그의 데뷔작이었다. 극 중 희준 역을 맡은 박정민은 ‘파수꾼’의 성공과 함께 충무로의 신성으로 떠오르며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필모그래피는 착실하게 쌓아갔지만 대중적인 인기하고는 연이 없었다. 영화 ‘전설의 주먹’에서 황정민의 아역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는 듯 했지만 이후 출연한 작품들에서 연기력 칭찬을 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유명세는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급함은 없다. ‘나 떠야 돼’라는 부담감도 없다. 연기가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오래도록 연기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간의 성공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는 “지금은 제가 대중이 원하는 걸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니까요”라며 스스로를 낮췄다.

“조급함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순간순간 튀어나오긴 하지만(웃음). 지금 하는 일이 재밌으니까요.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떠야 된다는 부담도 없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길을 선택했는데 내가 힘들어 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부담감 정도예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모자라고 저의 어떤 하드웨어와 제가 가진 재능이 아직 모자라고 이 시대 부합하지 않나보다 생각하죠. 관객들이 보고 싶은걸 내가 아직 못 보여 주나보다 생각해요. 기대하는걸 보여주기 위해선 시간이 흐르거나 내가 좀 더 날 잘 알고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연기력 칭찬 많이 받고 있지 않나. 기자의 말에 한결같이 돌아온 답은 “‘파수꾼’의 잔상 때문일 거예요”라는 대답. ‘파수꾼’이 워낙 호평을 받았고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파수꾼’에 출연했던 자신에 대한 이미지마저 좋아져서 연기도 좋게 보인다는 게 박정민의 주장(?)이었다.
“가장 닮아있는 캐릭터로 데뷔를 해서 그런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때는 감독님도 내 안의 어떤 면을 발견하고 저도 제가 몰랐던 면을 발견하고, 좀 생각이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한 이유는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겉은 약해 보이는데 속이 강해보이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겉은 왜소하고 약해보이고. 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고집도 있고 자의식도 강하고요. 저랑 잘 맞은 옷을 입은 것 같았죠. 이후에 저한테 연기를 잘한다고 칭찬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파수꾼’의 잔상이에요(웃음).”
너무나 잘 맞는 옷을 입고 시작해서일까. 이후 박정민은 연기를 하면 할수록 고민이 커졌다고 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도 있었고, 연기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았다. “제가 최근에 ‘위플래쉬’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더 초라해졌어요”라며 한숨을 푹 내쉰 박정민은 연기자로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맞지 않는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내 모습이 아닌 캐릭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데뷔 이후로 나름대로는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뷔를 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녹록지 않더라고요. ‘파수꾼’은 상업영화도 아니었고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영화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한 영화기 때문에 오로지 흥행 보다는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찍은 거라면 그 뒤로는 돈을 받고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인데 좋은 영화로 데뷔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요즘도 그래요. 가면 갈수록 롤이 커지는데 그러다보니 더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연기를 놓을 수 없는 건 연기가 가장 재밌기 때문이다. 그 안의 소심한 면도, 신중한 면도 연기를 할 때만큼은 다른 사람이 돼 다른 성격을 드러내 보이니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릴 수 없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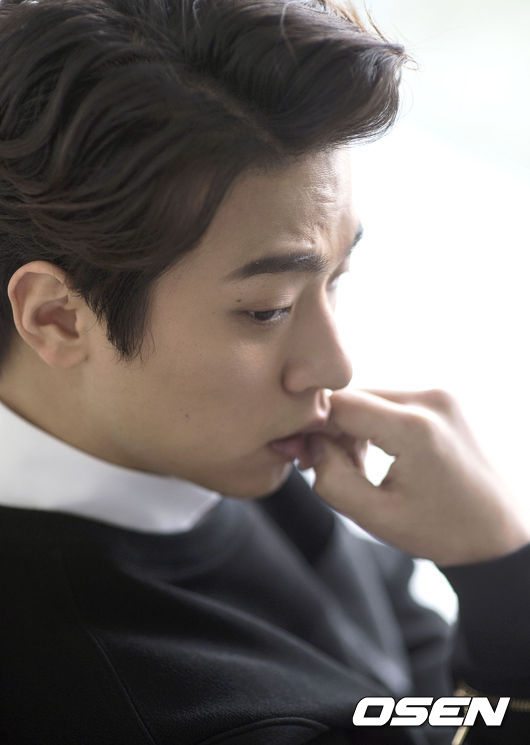
“연기가 내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어요. 저는 주목받는 걸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집중하고 주목하면 참을 수가 없죠. 말도 잘 못해요. 되게 소심하고 사람들한테 상처주지나 않을까 말조심하고요. 그런데 연기할 때는 안 그래도 되잖아요. 연기할 때는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말은 대사니까 그렇게 주목받는 건 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좋아요. 어릴 때는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모범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내 안에 만들어진 응어리가 연기할 때 풀리는 느낌이예요.”
trio88@osen.co.kr
이대선 기자 Sunday@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