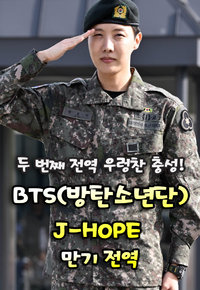우리말 ‘아무’는 특정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이르는 인칭 대명사다. 그런데 이 말은 뒤에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 때로는 ‘전부(All)’가 되고 때로는 ‘공허(Nothing)’가 된다. ‘아무도 없다’는 말과 ‘아무나 와라’에서의 아무는 극과 극으로 딴 말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같은 낱말처럼 쓰인다.
시인 이근일은 ‘아무’라는 낱말의 다면성에 주목했다. 비어 있지만 무언가로 꽉 차 있는 영(零, 제로)의 세계를 일상어 ‘아무’에서 찾았다. 이근일은 시집 『아무의 그늘』에서 아무가 머무는 방에 다가가 “안에 아무도 없습니까”라고 묻는다. 아무가 있지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답은 없다. “아무도 없으므로 저 방은 아무가 머무는 방임에 틀림없다”고 말하는 시인은 아무의 방을 들여다 볼 때마다 늘 조심스럽고 가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마치 깨달음의 세계를 엿본 이의 설레는 마음처럼 말이다.
‘아무의 방’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부질없다. 사랑뿐만 아니라 부귀와 꿈, 뭐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방이 아무의 방이다. 그 아무들은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의 그늘은 덧없고도 덧없다. 시인이 보는 세상살이는 아무에게 드리운 그늘과 그 그늘에서 헤어나려는 이들의 몸부림으로 구성 돼 있다. 더구나 이 아무는 전염성도 강해 빛 속에서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아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는 또한 전부이기도 하기에 아무의 그늘만 살짝 벗어나면 세상은 온통 신기한 것 투성이다. 아무와 아주 가까이 있지만 그늘에 가려 보지 못할 뿐이다. 아무의 무심함을 깨달은 이근일 시인은 아무의 곁에 있는 ‘소중한 것’을 보았고, 그 이야기를 시집 『아무의 그늘』을 통해 틀려주고자 했다. 사람과 소통하는 차원을 넘어 세상을 구성하는 사물과 소통하려는 시도가 『아무의 그늘』을 꿰뚫는 관조다.
시인은 “세상이 이러하니 동네 외곽의 그 연못을 흠모할 수밖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 한 줄기 빛을 받아 마시고 그토록 다채로운 빛을 퍼뜨리는 세계를. 지나가는 아무를 잠시 멈춰 세우고 의미 없이 건네는 그 세계의 말들이 나는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상은 아무도, 아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아무가 아무에게.”라고 외치는 시인의 목소리에는 어느덧 허무의 그림자도 내려앉는다. 그러나 시인의 외침은 반드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인이 깨달은 아무의 깊이가 이 시집을 읽은 독자들에게 어렴풋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에서 태어나 서울예대 문화창작과, 서울과기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서울과기대 문예창작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근일은 200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촉망받는 시인이다. 이번에 첫 시집 『아무의 그늘』을 내면서 예단을 불허하는 그의 세계관을 세상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다.
시인이 천착하는 세상은 단지 인간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다. ‘아무나 사는’ 그 세상을 벗어나 좀더 넓은 세상, 좀더 다른 차원으로 뛰어 나가기 위한 몸부림이 뚜렷하다. ‘아무의 그늘’에 수록 된 ‘지난날’이라는 시를 보자.
‘죽은 나무에서 버섯이 자란다. 사람들은 버섯을 캔 뒤 숲에서 나오고 다시 숲에 든다. 다시 숲에 든 사람들은 가슴을 열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한다. 마치 불순한 생을 정화하려는 듯이….’
그런데 이 숲에서는 ‘지난 날’ 장례식이 있었다. 시인은 ‘나는 그날 흙 속에 관을 내리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쉬 설명하기 힘든 죽음의 무게를 느껴봤다’고 읊었다.
시인이 보는 세상은 현실이면서 동시에 현실이 아닌 곳에 존재하고 있다. 현실이 아닌 곳은 ‘꿈’의 세계이고, 현실의 그 곳은 ‘죽음’이 지나가는 곳이다. 꿈과 죽음, 두 낱말은 시인의 시적 감수성 속에 마치 한 세상처럼 녹아 있다. 꿈과 죽음을 넘나드는 몽상의 세계는 섬세하면서도 아련한 시어로 환생해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다. 그 세계는 이미 반쯤은 깨달음의 반열이니까. /100c@osen.co.kr
[사진] 시인 이근일과 그의 첫 시집 『아무의 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