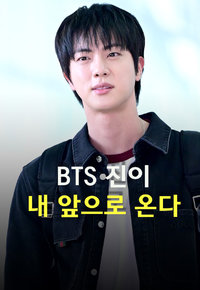11년전의 캐치볼 파트너
[OSEN=백종인 객원기자] 얘기의 시작은 과거로 간다. 11년 전, 그러니까 2011년 9월이다. 석양이 차베스 래빈(Chavez Ravineㆍ다저 스타디움)을 비추고 있다. 늘 그렇듯. 선수들이 게임 준비에 바쁘다. 다만 평소와는 다른 날이다. 누군가의 고별전이다. 일본인 투수 구로다 히로키(당시 36세)다. 그는 곧 FA가 된다. 팀은 예산 때문에 잡지 않는다. 떠나는 게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마지막 등판인 셈이다.
선발 투수의 필수적인 준비 의식이 있다. 캐치볼이다. 대강 주고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어깨가 풀릴 만큼 전력을 쏟는다. 100미터 먼 거리도 마다 않는다. 외야 끝에서 끝으로. 강렬하고 멋진 포물선이 만들어진다. 수준급들의 경우는 그 자체가 장관이다. 물론 파트너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날은 애매했다. 평소 ‘짝’이 나오기 어렵다. 투구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다. 23세의 클레이튼 커쇼였다. 그 시즌에 이미 233이닝이나 던졌다. “더 이상은 절대 안된다. 당분간은 공도 만지지 말라.” 구단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아랑곳없다. “히로(구로다 히로키를 그렇게 불렀다)의 마지막 경기다. 당연히 내가 캐치볼을 해줘야 한다.” 말릴 틈도 없다. 글러브를 들고 외야로 달려나간다. 그만큼 둘의 관계는 각별했다. 훗날 커쇼의 얘기다. "히로는 내가 무척 존경하는 투수다(I have a lot of respect for Hiro).”

유난히 허름해 보이는 커쇼의 1년 2000만 달러
22번 투수의 잔류가 확정됐다. 지난 6일(한국시간) 오피셜이 나왔다. 1년 2000만달러(약 262억원)의 조건이다. 사이닝 보너스 500만달러가 포함된 금액이다.
물론 거액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아니다. 천문학적 숫자가 쏟아지는 요즘이다. 40을 넘기는 저스틴 벌랜더는 사실상 3년짜리 딜을 성사시켰다. 평균 연봉이 4000만달러(약 530억원) 이상이다. 동갑인 제이콥 디그롬도 5년 1억8500만달러에 사인했다. 1년에 3700만달러(약 490억원) 꼴이다. 하다못해 방출 선수도 엇비슷한 대우다. 외야수 코디 벨린저 말이다. 1년 1750만 달러(약 230억원)를 받기로 했다. 이런 상황이다. 유난히 커쇼만 작아보인다.
현실은 어쩔 수 없다. 분명 예전 같지 않다. 구속은 뚝 떨어졌다. 포심 평균이 90.7마일(146km)이다. 커브와 슬라이더로 버틴다. 어디 그뿐인가. 걸핏하면 병가다. 허리 부상은 고질이다. 선발 횟수는 22번으로 줄었다. 한창 때는 31~33번도 너끈했다. 이닝수도 반감됐다. 120이닝 언저리가 고작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커쇼다. 한때 천상계에 머물던 스타다. 다저스의 상징이고, 간판이다. 나이도 충분하다. 이제 30대 중반이다. 게다가 성적 자체도 나쁘지 않다. 올 시즌 12승 3패였다. ERA는 2.28로 톱 레벨이다. 전통적 스탯은 여전히 우호적이다. 그런데 1년이라니. FA계약 치고는 심한 디스카운트다.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나올 법하다.

시즌 직후 전화 한 통화로 거취를 정리하다
한 매체가 계약의 뒷얘기를 다뤘다. ‘FOX스포츠’다. 인터뷰를 토대로 이렇게 전했다. “디비전 시리즈서 패한 다음 날이었던 같다. 내가 직접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난 이미 결정했어요’라고. 그게 끝이다.” (커쇼)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 다저스의 탈락이 결정된 직후다. 많이들 수군거렸다. ‘커쇼가 남을까?’ ‘떠난다면 어딜까?’ ‘진짜 텍사스로 가나?’ ‘다저스가 잡을까?’ ‘잡는다면 몇 년이나 줄까?’ 이런 물음표가 무수히 떠다닐 시점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다. 당사자는 일찌감치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저스에 알렸다.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발표는 한달 정도 미뤄졌다. MRI도 찍고, 몇 가지를 체크한 것 같다.
이 말이 맞다면 어이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바보 같은 흥정이다. 짤막한 전화 한 통화로, 그것도 장이 열리기도 전에 끝나버렸다. 겨우 1년짜리 ‘그저 그런’ 딜로 말이다. 순진하고, 바보같은 일이다.
하지만 당사자는 태연하다. 반응이 기가 찰 정도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게 너무 평화롭다. 일단 팀을 먼저 선택한다. (계약) 내용은 그 다음이다. 그게 내 자신을 위한 방식이다.” 그의 얘기가 이어진다. “ (디비전시리즈에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나.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마치 ‘계약 따위는 상관없어, 난 이기는 데만 집중할 거야’ 그런 투다.

남은 커리어 동안에도 ‘평화로운’ 1년 계약?
‘FOX스포츠’는 이렇게 정리했다. ‘그가 1년 계약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며, 남은 커리어 동안에도 계속 1년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이 대목이다. <…구라다>가 11년 전 캐치볼을 떠올린 이유다.
커쇼가 존경한다던 그 투수, 구로다 히로키가 그랬다. 그는 다저스에서 나와 양키스로 갔다. 3년간 성적은 괜찮았다. 매년 두 자릿수 승리, 평균 200이닝을 넘겼다. 선발을 개근하며 32~33번씩을 채웠다. 하지만 그는 다년 계약을 거부했다. ‘1년만’이라는 원칙을 지켰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다.
“더 이상 내년을 위해서 야구할 나이는 아니다. 내가 지금 왜 야구를 하는 지 생각하면서 늘 완벽하게 태우고 싶다. 다년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2년째의 일이 머리를 지나친다. 여력을 남기며 시즌을 치르고 싶지는 않다. 리스크를 팀에 떠넘기지 않고, 매년 결과로 내 자신의 가치를 어필해야 한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의 공포, 로테이션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은 언제나 짊어지고 가야할 나의 몫이다.”
지금의 22번이 그렇다. 오래 전 캐치볼 파트너와 비슷한 얘기를 한다.
"어디서 뛰어야 할 지를 남에게 듣고 싶지는 않다. 그건 직접 내가 고를 일이다. 남은 커리어 내내 그렇게 하고 싶다. 테이블 위에 몇 달러만 남아 있어도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칼럼니스트 일간스포츠 前 야구팀장 / goorada@osen.co.kr